Lessons from private equity any company can use (어떤 회사라도 상요할 수 있는 PE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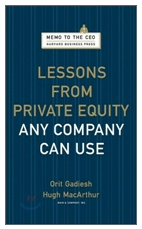
저자는 Orit Gadeish라는 Bain & company의 Global PE Practice 파트너이다. 우리나라에는 번역판이 아직 안나온것 같은데,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책은 HBSP(Harvard Business Review Press) 에서 나온 책으로 Memo to the CEO 라는 시리즈의 하나인데, 책이 매우 얇고 (120페이지 정도) 보통 책 사이즈의 반 정도라서 일반 책으로 보면 약 50페이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다. 하지만 얅은 분량에 비해서 내용은 알차다. 알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시리즈의 제목이 Memo to the CEO 인만큼 이 책의 독자들은 주로 기업체의 CEO 혹은 나처럼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PE (private equity, 사모펀드)에서 사용하는 경영기법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PE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외국계 PE에 대해서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PE들은 기업을 사서 3-5년 사이에 그 가치를 2-3배, 높게는 10배까지도 높여서 다른 곳으로 판다. 결국 그 과정 상에서 일반 기업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에 턴어라운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턴어라운드 과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굉장히 강한 강도로 진행된다는 점. 그 이유는 PE의 투자주기(investment horizon)이 3-5년 정도로 짧기 때문인데, 이 기간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여 시장에 되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이 안좋으면 그 이상 깔고 앉아 있기도 하지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시간적 제약과 경영성과에 대한 높은 압박 때문에, PE 들은 기업을 턴어라운드시키는데 있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PE들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 측면에서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방식은 꼭 기업을 PE에 팔지 않고, 기업의 CEO인 내가 직접 실행할 수는 없을까? 우리 회사의 가치가 3-5년 사이에 두배가 될 수 있다면 과연 마다할 CEO 가 어디있겠는가?
이 책에서 말하는 PE의 성공공식은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 Define the full potential (최대 잠재치를 설정하라)
- Develop the blueprint (블루프린트 – 청사진을 만들어라)
- Accelerate the performance (퍼포먼스를 가속화시켜라)
- Harness the talent (인재를 활용하라)
- Make equity sweat (제대로 돈벌게 하라)
- Foster result-oriented mind-set (결과중심의 문화/마인드셋을 정립하라)
이 가운데에서 몇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Full potential
최대 잠재치를 설정하는 것은 그 기업이 최대한으로 비즈니스를 개선시킬 때 ‘이론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매출, 이익, 점유율 상의 수치를 나타낸다. ‘내가 정말 독한 마음먹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과정은 주로 PE가 기업을 사기 전에 실사(Due diligence)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파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기업을 사고 나서 이 과정을 실행했다가 깜짝 놀랄만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 곤란하다.
놀랍게도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 자신의 최대 잠재치(full potential)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늘 해 오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거나, 스스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PE들이 기업을 사서 턴어라운드 시키는 확률도 높은 것일지도 모른다.
Blueprinting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블루프린팅 (blueprinting)작업이다. 기업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3-5가지 추진과제(initiative)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블루프린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 많은 과제를 도출해도 어차피 그대로 다 이루기 힘들고, 자원을 그렇게 많이 배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3-5가지만 뽑아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3-5가지 추진과제에 대해서 3-5년간 집중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추진과제가 생기거나, 3-5년보다 더 길어지는 것은 PE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Talent & Compensation
‘인재를 활용하라(harness the talent)’에서 재미있었던 내용은 그 인재들이 꼭 기업의 외부에서 올 필요도, 내부의 인재를 100% 활용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언급한 최대 잠재치를 blueprint에 따라서 잘 이행해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PE는 그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한 금액의 보상을 해주게 된다.
(이 부분은 finance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잘 이해가 안되시면 넘어가셔도 된다)
Working capital
사실 나에게는 Make equity sweat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금흐름이 가장 중요하고(cash is king),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본(working capital)관리라는 것이다. PE 혹은 일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결과지표 중에 하나가 EBITDA인데, EBITDA 에서 현금까지 가는 과정에서 Capex 와 Debt schedule (interest payment)는 control-ability 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working capital management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정리해서 이 레슨을 일반 기업에 적용하자면,
일반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얼만큼 잘 할 수 있는지 최대한의 잠재치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갈데까지 간다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것인지 모르고서야 어찌 기업의 한계를 규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열심히 잘하자’라는 막연한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깨끗하게 한번 정의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추진과제 설정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매년 새로운 추진과제를 내느라고 전략부서의 사람들은 연초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그 추진과제들이 무엇인지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실 추진과제라는 것들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렇지만 PE가 인수한 회사에서는 몇가지 과제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흠뻑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가지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leverage, 즉 부채 차입이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 정도가 이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이다.
나가며…
사실 내가 더 궁금했던 내용은 PE 들은 주로 안정적인 리테일이나 일반재 및 소비재 등의 사업을 좋아하는데, 위에서 말한 이런 접근방법이 그 외의 산업에서도 잘 적용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점이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서 아쉽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들을 경영하시는 CEO들이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책의 서두에 satisfactory under-performance 라는 말이 나온다. 조직원 모두가 적당한 선에서 일을 그치고 마는 현상을 일컷는 이러한 ‘만족스러운 저성과’ 라는 말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에 만연한 증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PE에서 독한 마음을 먹고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물간 이론으로만 치부하거나, ‘상생의 철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특정 기업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한 것 같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대해서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간 안타까운 현상이 아니다. 주주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고,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나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며, 결국 기업이 잘 되는 경우에 생기는 많은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특이한 사정상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그 부작용들을 치료해야지, 아주 효율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기업인들이 PE로부터의 레슨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글 :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5749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