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장문화에서 점심은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다. 적어도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나는 그렇게 배웠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람을 사귀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점심식사시간이었다.
아니면 따로 약속이 없더라도 같은 부서의 동료들과 같이 나가던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잡고 둘이서 나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문화였다. 혼자서 가서 식사를 하면 웬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루저’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점심약속을 미리미리 잡아놓고는 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나서는 대개 다같이 찻집이나 카페로 이동해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과정이 뒤따른다. 일이 바쁘거나 입맛이 없어서 점심을 거르거나 간단히 하겠다고 하면 “다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하면서 같이 식당에 가자고 권유하는 선배들이 많았다. 비생산적일 수는 있지만 이런 문화를 통해서 동료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고 외부인맥도 늘리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 사뭇 문화가 달랐다. 미국직장인들은 특별한 점심약속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라이코스의 경우 일단 구내식당이 없고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파는 카페테리아는 걸어서 5분정도 떨어져 있는 옆 건물에 있었다. 그외의 식당은 제일 가까운 곳도 차를 몰고 가야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간단히 가까운 곳에서 먹을 거리를 사와서 혼자 먹는 정도였다.

동료들과 같이 담소하면서 먹는 것을 즐기는 몇몇 직원들은 냉장고와 싱크대가 있는 ‘키친’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자기 책상에 앉아서 가볍게 점심을 먹는다. 그야말로 우걱우걱 먹는다.

사람들이 싸오는 그 도시락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이어서 중국인등 아시아인들은 우리처럼 제대로 밥이 들어간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간단히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싸온다.
심지어 전자렌지에 데워먹는 파스타나 햄버거 같은 냉동식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저런 것을 먹나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몇명이서 같이 피자를 주문해서 한조각씩 먹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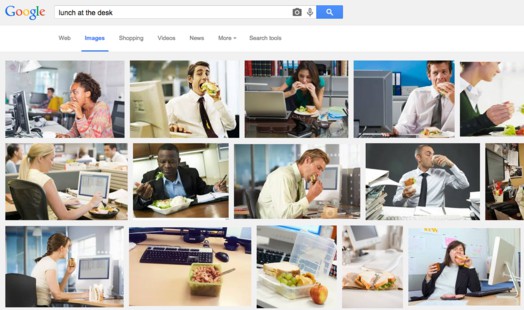
즉,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직장 점심문화를 정의하면 “대충 때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있더라도 음식을 자기자리로 가지고 가서 책상에 앉아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직장인의 67%가 책상에서 점심을 먹는다고 할 정도다. 뉴저지에 있는 삼성전자의 미국지사 구내식당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 곳에서도 한국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외국인들은 식사를 가져다 자리 자리에 가서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호화로운 공짜점심을 제공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미국전체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회사가 공짜점심을 제공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통해 소통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이런 회사에서도 점심거리를 식당에서 받아다 자기자리에 혼자 앉아 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점심을 간단히 먹는 문화는 아마도 식사시간을 최소화하고 일에 집중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식당이 멀어서 밖에서 먹고 오면 한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그럴 시간이 10분만에 식사를 후딱 해치우고 일을 빨리 끝내려는 것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는 야근이 없는 문화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낸만큼 집에 제시간에 갈 수 있다.
솔직히 이런 미국인의 점심문화는 내 마음에 안들었다. 미국직장에서 동료간에 ‘정’이 한국과 비교해서 없고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마 이런 드라이한 점심문화의 영향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나는 라이코스에 갔을 때 꺼꾸로 이런 문화를 이용했다. 나는 한국식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청했고 같이 인근 식당에 가서 식사했다. 점심같이하자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선약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식사상대방을 구해서 점심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 렉싱턴시내 한국식당에 가서 돌솥비빔밥을 시켜주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많은 직원들과 서로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 음식을 앞에 놓고는 업무미팅때는 할 수 없는 가볍고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개인사를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디에서 자라났으며 학교를 다녔고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고 자녀들은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는 기구한 가족사와 이혼경력까지 술술 털어넣는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미국인들의 삶과 고민 등에 대해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간의 신뢰를 쌓았다고 할까. 그들도 알고보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식당에 내 차를 타고 나란히 앉아 같이가고 식당에 마주 앉아 대화하면서 덤으로 영어회화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처럼 미국에서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청하는 것은 “NG(No Good)”이지만 점심식사를 청하는 것은 미덕이다. 밀린 일을 따라잡기 위해서든, 공부를 위해서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든 점심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직장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글 : 에스티마
원글 : http://goo.gl/g4A44s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